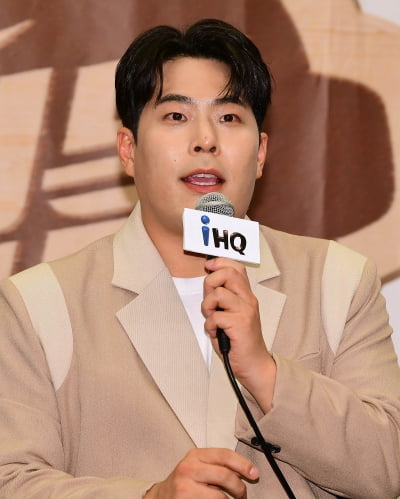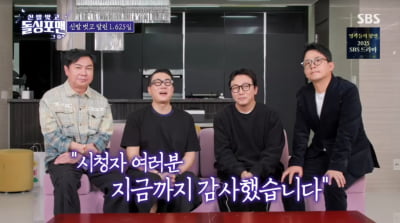![외부에 곡 팔고 받은 돈, 기획사가 혼자 '꿀꺽'…법원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말아야" 지적 [TEN스타필드]](https://img.tenasia.co.kr/photo/202505/BF.40510005.1.png)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연예 기획사가 저작인접권을 제3자에게 판매한 뒤 "아티스트에게 수익을 정산해 줄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정산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획사가 부당한 일을 해도 아티스트가 항의하기는 쉽지 않아,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연예 기획사 MPMG(민트페이퍼)와 한 정산 대행 기업이 벌인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저작인접권 양도 자체는 회사의 재량"이라면서도 "전속계약에 따른 대내적 의무, 즉 아티스트에 대한 수익 정산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작인접권은 전속계약서의 음원 수익 분배 조항에서 언급되는 '음원 수익'과 같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서 관리하는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곡을 작곡하거나 작사·실연하지 않아도 음반 제작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제작사(연예 기획사)가 100% 가져가는 권리다. 이로써 음반 제작을 주도한 기획사는 음원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 전체의 약 48%를 가져가게 된다. 한음저협에서 분배하는 저작권료가 전체 수익의 10.5%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아티스트는 음원 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적은 수익만을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표준계약서에는 전속계약 체결 시 저작인접권 수익을 회사와 아티스트가 나눠 갖는 조항이 포함된다. 분배 비율은 계약마다 다르다.

문제는 전속계약이 유지 중인 아티스트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기획사가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양도했을 때 생긴다. 이번 사건이 그런 사례 중 하나다.
한 음반 업계 관계자는 "아티스트에게 수익 배분권이 있는 음원을 회사가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외부에 팔았다는 게 문제다. 이는 단순히 개별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재산권 보호 수준이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할 땐 반드시 권리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 흐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수 법률사무소 더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획사가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티스트는 받지 못한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