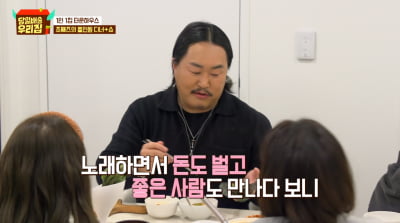![[강명석의 100퍼센트] 세종에게서 배우는 현실의 통치철학](https://img.tenasia.co.kr/photo/202001/2011101811093928956_1.jpg)
젊은 이도의 말대로 “오래 사는 것”은 아들이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설계해야 한다. 태종이 “피를 묻히며” 조선을 세웠다면 세종(한석규)은 말과 법으로 다스린다. 태종이 정도전의 가족들을 죽이려 한다면 세종은 구해서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려 한다. 태종은 마방진을 푸는 대신 마방진을 모두 엎고 ‘ㅡ’ 하나만 남겼다. 세종은 끝끝내 마방진의 숫자들을 모두 이용해 정답을 낸다. 아버지는 칼로 신하들을 죽이며 패권을 만들었고, 아들은 경연을 통해 모든 신하의 의견을 들으며 통치하려 한다. 아버지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왕과 오히려 아버지를 지키며 살아야 했던 노비의 아들,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사는 선비. 는 각각 다른 계층의 아들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잇고, 넘어서고, 결국 아버지 없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다.
대화와 설득의 세종이 던지는 강한 질문
![[강명석의 100퍼센트] 세종에게서 배우는 현실의 통치철학](https://img.tenasia.co.kr/photo/202001/2011101811093928956_2.jpg)
의 닮은꼴은 기존의 사극이 아니다. 차라리 에 가깝다. 왕과 고교야구 매니저는 각각 부강한 나라와 전국대회 진출이라는 성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모두 만족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의 서두는 지금까지와의 사극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가장 정치적인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극은 권력을 잡는 과정을 그리면서 지금의 권력구도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현재를 반영한다. 반면 는 아직 현시대의 어떤 모습도 묘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식의 시대, 다가올 시대의 통치철학에 대해 말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통치자가 해야 할 일
![[강명석의 100퍼센트] 세종에게서 배우는 현실의 통치철학](https://img.tenasia.co.kr/photo/202001/2011101811093928956_3.jpg)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을 대변하는 통치자가 선택해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 등장했다. 새로운 세대가 아버지와 다른 시대를 만들겠다고, 올바른 과정과 행복한 성과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하는 드라마. 왕과 신하와 백성이 한데 모여 이야기할 수 있고,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이 백성의 권리라고 말하는 드라마.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정치 현실을 반영할 의도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시대를 세대와 통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를 담는다. 그리고, 모두가 다음의 ‘정치’에 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통치철학에 대해 말하는 드라마가 시작됐다. 정말 현실에서도 세종의 정치는 가능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를 보며 정치에 대해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글. 강명석 기자 two@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