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의 10 Voice] <그것이 알고 싶다>, 어둠 속 빛을 향한 사투](https://img.tenasia.co.kr/photo/202001/AS10LhpOdWYCs2cECYr6WEGdFfoeylpokZXf.jpg)
좌절의 냉소를 예방의 고민으로 바꾸는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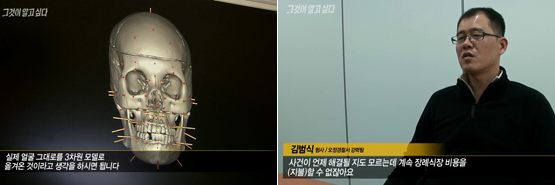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것을 냉소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스스로 영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대신, 관찰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시신을 잃은 상황에서 제작진은 행정 담당자와, 담당 형사, 행정 이론 전문가의 의견을 집요하게 취합했다. 그리고 좌절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좌절을 예방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려 했다. 이러한 방송의 지향은 지난해 9월 방송된 2부작 ‘무방비 도시’를 통해 뚜렷하게 감지된 바 있다. 새로운 미스터리를 제공하는 대신, 이미 알려진 사건의 틈새를 되짚어 보았던 이 방송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떤 순간을 간절하게 예측했었다. 지난 11월 방송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어느 시골마을의 경고’편에서도 응급 환자를 살려내지 못한 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업인이자 개인으로서의 실패를 토로하는 그의 눈물을 담아 낸 바 있다. 비난하고 고발하는 일은 오히려 쉽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고자 한다. 영웅이 나타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괴물이 오는 통로를 찾아내고, 주시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좌절로 본 사회의 실패
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src="https://img.tenasia.co.kr/photo/202001/AS10HVz3SbSMP.jpg" width="555" height="185" border="0" />
지난해의 성취가 방향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연말 방송된 ‘2012, 눈먼 자들의 도시’는 그 방법에 대한 확신이 드러난 방송이었다. 피해자들을 구해냈지만 결국 그들의 안전을 회복해 주는데 실패했음을 보고한 사냥꾼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이 방송은 개인의 목격과 의심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발생함을 호소했으며, 외면이 곧 괴물의 배양액임을 강조했다. 물론, 이날 방송이 외면의 담합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방식은 거칠었고, 비극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과 책임소재가 분명한 일을 동일 선상에서 거론 하는 것은 낭만적인 시선에서 비롯된 오류에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일부 회차는 선정주의가 의심되는 소재와 화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고 조금 더디더라도 방송이 더듬거리며 찾아가는 목적지가 꿈에서 본 선명한 풍경이 아니라 어둠 속에 도사린,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제 제작진이 알고 싶은 것은 사건의 해결에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가 그토록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다.
둑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 했고, 구멍을 모른 척 한다면 누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누군가는 지레 포기하고 편하게 마음먹을 것을 권하고, 누군가는 개인의 희생으로 구멍에 팔뚝을 들이 밀 것을 종용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을 고쳐 낼 수 있는 다수의 합의에 근거한 절차,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송에 부여할 수 있는 의무라면 계속해서 시스템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시스템을 감시하는 일일 것이다. 시신의 이름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어째서 신원 미상의 시신을 계속해서 붙들어 둘 수 없는지 이유를 안다. 참을 필요도 없고, 희생할 이유도 없으며,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새롭게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듬성듬성한 희망보다 촘촘한 고민이 위로가 되는 시절, 많은 방송들이 얼굴과 지문을 잃어버린 시절에 아직도 힘이 되는 방법을 잊지 않은 방송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든든해지는 것이다.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