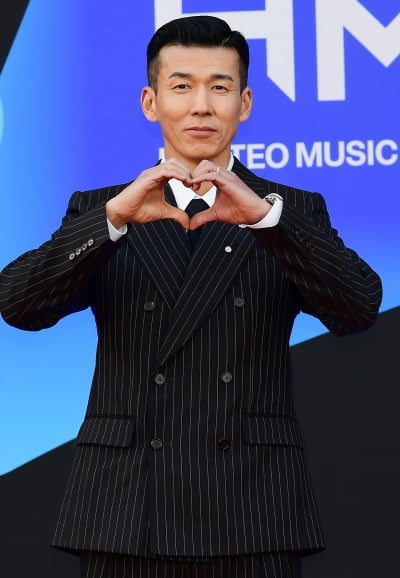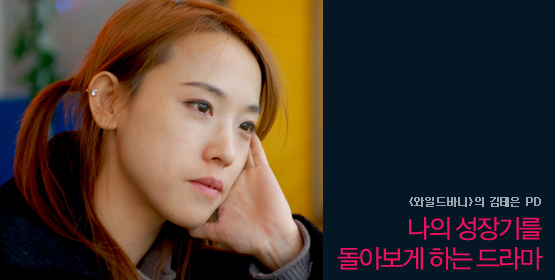
“지금은 왜 그렇게 어둡고 화가 났던가 싶지만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았고, 수업 시간에도 앉아는 있었지만 항상 이어폰을 꽂은 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과목을 공부했어요.” 말 그대로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를 보내던 십대 소녀가 마음을 의탁한 건 이어폰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음악과 뮤직비디오라는 신세계였다. “언니의 친구를 통해 그린데이의 ‘Basket Case’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는데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이후 뮤직비디오를 원 없이 틀어주던 KM과 M.net이라는 음악방송이 등장했고, 그녀는 케이블을 설치한 큰아버지 집에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쯤에서 어릴 때 재밌게 본 음악방송에 입사해 성공했더라는 낯 뜨거운 입지전적 스토리를 기대할만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그렇게 계획적이었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다. “음악도 되게 좋아해서 만들어보고, 뮤직비디오가 좋아서 음악방송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오다보니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 일을 즐기는 것 같아요.” 이후 와 로 변화무쌍하게 이어지면서 헛짓도 많이 하고 어이없는 행동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노라 말하는 그녀의 성장기가 궁금해지는 건 그래서다. 성장의 중요한 고비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 그녀는 다음의 드라마들에 기대 이야기했다.

1988년
“사실 어렸을 때 봤던 은 기억이 희미해요. 오히려 나이를 먹고 나서 김종민 작가의 추천으로 다시 찾아보고 열두 살 무렵의 저를 떠올리게 됐죠. 저 역시 첫사랑이나 아픔, 우정 같은 것들이 똑똑하게 기억나는 건 열두 살 때부터예요. 그 시기에는 가족을 포함한 세상이 평화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을 그대로 말해주는 게 첫 에피소드의 마지막 내레이션이에요. ‘땅거미가 질 때 TV 빛이 하나씩 점멸할 즈음이면 그곳엔 각자의 이야기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고통으로 연계되고 사랑을 위해 투쟁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웃음을 선사하며 우리를 눈물짓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어렸을 때의 평화로운 저녁시간을 떠오르게 하는 말이에요.”

2007년
“가 좋았던 건 감독이 정말 십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서였어요. 예전에 십대를 그린 드라마는 철저하게 어른의 시선으로 본 작위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문제아가 있으면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인과관계를 만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평범한 집에서 자랐지만 십대 후반에는 이유 없는 분노와 혼란이 있었고요. 거식증에 걸렸거나 약물을 하고 섹스 중독에 걸린 의 십대 역시 그래요. 이 드라마는 십대라서 갖게 되는 혼란의 시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미덕이 있어요. 문제아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 착한 아이로 선도되는 그런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죠.”

2002년, 극본 인정옥, 연출 박성수
“지금 생각해도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십대 후반에 다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십대에는 재밌는 걸 저지르며 살았죠. 그 때 만난 드라마가 에요. 사실 이 시기에는 좋아하던 뮤직비디오를 직접 만들고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일에 대한 열정을 많이 쏟은 대신 막상 사람에 대해서는 무신경했어요. 연애를 해도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싶었어요. 복수와 전경의 사랑이 어긋나서 슬픈 게 아니라 걔네들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슬펐던 거 같아요. 말하자면 가족을 비롯한 내 주위 사람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걸 후회하게 된 계기가 됐죠.”

글. 위근우 eight@10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